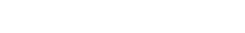
역사/문화
통곡의 길

- 솔치재
- 어음정
- 역골
- 주천3층석탑
두견새 구슬피 울던 밤 목숨 바쳐 섬겨야 할 임금을, 동강에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 되게 했던 사약을 손수 들고 가 전했던 신하들이 울고 또 울며 걷던 애달픈 통곡의 길

솔치재
숙부인 세조(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1457년 삼복더위가 한창인 음력 6월 22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을 떠나 유배길에 올랐다. 단종의 유배길에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어득해(魚得海)와 군자정(軍資正) 김자행,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 등이 군졸 50명과 함께 행렬을 호위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단종 행렬이 유배지인 영월로 진입하는 첫 번째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솔치재는 치악산 자락 해발 650m에 자리한 고개로, 원주에 해당되는 신림면 황둔과 영월에 해당되는 주천면 신일리의 경계가 된다. 단종이 지나던 그 옛날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무성한 고개였다. 그래서 그 이름도 솔치고개(松峙)라 하였다. 고된 여정을 밟았을 단종에게 그나마 이 푸른 소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었으리라 믿어본다.

어음정
단종은 서울을 떠난 지 닷새 만에 황둔에서 솔치고개를 넘어 영월 땅 주천에 첫 발을 내디뎠다.그리고 고갯길을 넘은 단종은 주천에 있는 마을에 도착해 우물에서 목을 축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음정이다. 단종이 이곳을 지나간 때는 1457년 음력 6월이었으니, 긴 걸음을 옮기다 무더위를 피해 머물렀던 것이다. 이후 이곳 마을엔 물미라는 지명이 붙었고, 후세 사람들은 이 우물을 단종임금이 목을 축였다하여 '御飮井(어음정)'이라 이름 붙였다. 넓디넓은 수풀에 오롯이 자리한 어음정은 어쩐지 서인이 된 단종의 깊은 한 숨과 닮아있다.

역골
단종 유배행렬은 주천면에 이르러 신일리에 닿았다. 당시 신일리에는 보안도(保安道) 소속의 신흥역(新興驛)이 있었던 역골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신흥역(新興驛)은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 영월, 평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단종의 발자취를 좇기 위해선 황둔(黃屯)과 신림(新林), 원주(原州)로 가는 402번 도로 오른쪽으로 난 옛길을 따르면 된다. 이곳은 그 옛날 보안도(保安道) 소속의 원주 신림역(新林驛)에서 치악산을 넘어오는 역로(驛路)였다. 역골은 현재까지도 금산 등과 함께 자연부락으로 남아있는데, 지금도 신흥동을 '역촌(驛村)' 또는 '역골'이라 부른다. 그 이웃에는 공순원(公順院) 원터가 남아있는데, 이를 따라 이곳 자연부락의 명칭도 '공순원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말들이 풀을 뜯던 '마래미'와 말을 사육하기 위해 역(驛)에다 지급했던 '마위전(馬位田)'이 있었던 곳은 지금까지 '마평(馬坪)'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있다. 마평 앞에는 큰 바위 하나가 서 있는데 이 바위를 '색시바위'라 부른다. 신일 4리에는 신흥동으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 역골 서낭당이 자리해 있기도 하다. 청(淸)의 연호로 도광(道光) 26년(1821~1850)에 세워진 서낭당이 있었으나 1972년 수해로 파손되고 지금은 신목(神木)인 커다란 느릅나무 두 그루가 남아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날이면 이곳 느릅나무가 있는 서낭당 터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주천삼층석탑
주천강 나루터에 닿은 단종 유배행렬은 주천강을 건너 탑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곳 탑거리에는 주천삼층석탑이 자리해 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두 탑과 법흥사를 연결하면 일직선이 된다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석탑은 사찰 경내에 세운 탑이 아니라 사자산 흥령선원을 찾는 신도들을 위해 제천과 무릉리에 세운 2기의 석탑과 함께 안내를 위해 세운 석탑 중 하나로 전한다. 원래 현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m 정도 제방 안쪽 강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주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제방 위로 옮겨 세운 것이라고 한다. 당시 탑 안에는 불상이 있었지만 1990년대 초에 분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