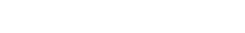
역사/문화
인륜의 길

- 배일치재
- 옥녀봉
- 청령포
죽은 단종대왕의 시신을 건드리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추상같은 어명에도 차마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거역할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시신을 수습하여 선산에 모셨던 영월호장 ‘엄흥도’가 지켜낸 인륜(人倫)의 길

배일치재
배일치마을에서 만난 배일치재에는 단종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서쪽을 향해 절을 하는 단종의 조각상 앞으로 ‘배일치’라고 쓴 표지석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단종임금이 유배길에 넘은 배일치재다. 굽이굽이 돌아 오르는 고개를 올라 힘겹게 배일치 고갯마루에 도착한 단종임금은 이곳에서 한양의 궁궐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았는데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들이었다. 단종은 이중에도 특히 성삼문(成三問)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 고개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개의 성삼문을 떠올린 단종은 타고 가던 가마에서 내려 서산에 기운 해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 이렇게 단종임금이 해를 보고 절을 한 고개라 하여 이곳을 ‘배일치(排日峙)’라 부르게 되었다. 자신을 지금껏 아껴주었던 사육신, 목숨으로써 충의를 지킨 신하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단종. 해질녘 이곳에서 단종은 또한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을 예감하며 그들의 넋을 위로한 것은 아니었을까.

옥녀봉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배일치재를 넘고 점말과 갈골을 지나 옥녀봉에 다다랐다. ‘옥녀봉’이란 명칭은 단종임금이 부인 정순왕후를 떠올리며 직접 지은 이름이다. 배일치를 넘어온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점말을 지나 돌고개를 넘고 갈골을 지나 옥녀봉에 이르렀다. 단종은 모양이 동그랗게 두메산골 색시처럼 수줍은 듯한 모습의 산봉우리를 보게 되었고, 이를 보고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 송씨의 다소곳하면서도 예쁜 모습이 불현듯 그리워졌다. 그리고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단종임금이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을 때 왕비인 정순왕후 송씨 역시 부인으로 신분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단종은 부인으로 강등된 아내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 둥근 산봉우리를 ‘옥녀봉(玉女峰)’이라 이름 하였다.

청령포
창덕궁 대조전에서 유배교서를 받고 1457년 음력 6월 22일 돈화문을 출발한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약 천리(千里) 길을 걸어 꼬박 일주일 후인 6월 28일 마침내 유배지인 영월의 청령포에 이르렀다. 이곳은 송림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서쪽은 육육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삼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한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강의 강줄기가 북쪽, 동쪽, 남쪽의 삼면을 말발굽에 박는 U자 모양의 편자처럼 휘감아 돌고, 서쪽은 험준하게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절해고도(絶海孤島)였다. 이곳에 누구든 가둬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형이었으니 유배지로서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어린 단종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이곳에서 외로운 유배생활을 시작하였다. 청령포 내에는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흔적을 알리기라도 하듯 금표비(禁標碑)와 단묘유지비(端宗遺址碑), 망향탑(望鄕塔), 노산대(魯山臺), 관음송(觀音松) 등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다.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령포는 수려한 절경을 자랑해 오늘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2008년 명승 제50호로 지정되었다.